클래식이랑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지만
발레복의 하늘하늘함에 이끌려서
발레라는 운동? 취미? 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재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는 박자감과 동작암기력
동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일까?
그건 아마 방송댄스, 라인댄스에서부터 이어져온 유구한 역사가 아닐까
그래도 도전한다
‘나는 원래 그래’
‘난 몸치야’
라고 말해왔지만
그렇다고 엄청 연습을 해본 것도 아니니까
그만큼 좋아했던 것도 없지만
찾은 거 같다 내 사랑
지독한 짝사랑할 준비 완료 ❤️

마치 나의 모습 같은 표지
시도 때도 없이 발끝을 들어보는 발레 초급자들 ㅎㅎㅎ
세상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다는 ‘세상의 쓴맛’을 아는 어른에게, 스트레칭의 고통이 보장하는 ‘달콤한 끝맛’은 바로 지금 내 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성취감이 된다.
발레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스트레칭
처음시작했을 때보다 각도가 늘어나고
고통이 줄어든 것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낀다
이토록
피부로(근육으로 ㅎㅎ) 느껴지는 성장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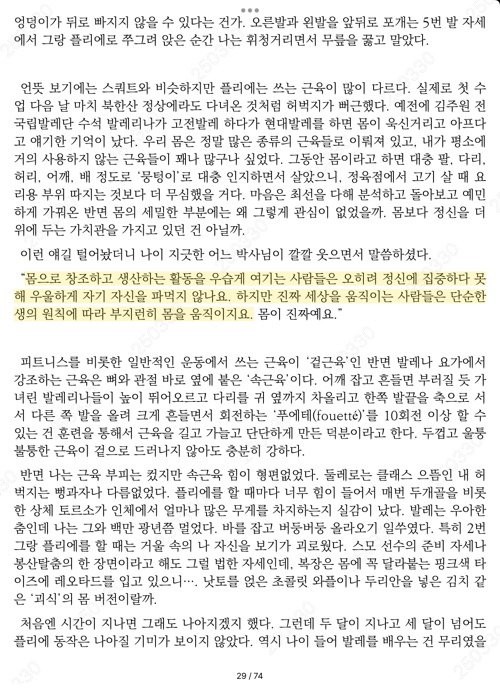
아무 생각 없이 뛰는 런닝처럼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인 거 같다
왜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은 우울함에 빠지기 쉽다던데
그럴수록 몸을 움직이며 생각을 비우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우울함 날려버리자!!!!

온몸에 힘을 주느라
땀이 나는 동작을 하다가
점프를 하면 갑자기 숨이 차서 정신이 없다
그런데 이거를 인생에 비유를 하다니
작가는 다르다
항상 동작을 따라할때마다
머리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
몸으로 전달이 안돼서
혼자 삐걱삐걱
다른 동작을 하고 있기 일쑤였는데(부끄)
여기서 찾았다
그 이유
그나저나 나는 왜 이렇게 동작 순서를 못 외우는 걸까. 선생님의 동작 시범을 세 번이나 보고도 못 외우기 일쑤였다. 나 자산의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모 정신과 전문의와 커피 한잔할 기회가 있을 떼 물어봤다. 그는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얘기 했다.
“춤이라는 건 사실 움직임이니까 이미지 정보잖아요, 그런데 최기자는 그걸 텍스트로 처리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의 시범을 보면서도 머리가 멍해지곤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동작을 언어 정보로 변환할 때 조금만 복잡해도 버벅거리고, 그 언어화된 정보를 다시 몸으로 표현할 때 또 버벅거리는 거다. 몸으로 배우는 게 느린 건 아무래도 그 때문인 듯했다.
맞다
오른쪽 왼쪽도 헷갈려하면서
그 와중에 언어로 입력하니
출력이 느릴 수밖에
후 그런데 방법이 뭔데요ㅜㅜ
저에게는 연습밖에 없겠죠?
부서질 듯 노력하고 몰입하는 삶은 익숙한 반면 적당히 힘 빼는 삶은 심리적으로 낯설다. 그러니 몸에서 힘을 빼는 방법을 알턱이 없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힘 빼기를 두려워했다. 나 자신이 소진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늘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늘 긴장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기자라는 직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어릴 때 이미 그런 마음의 습관이 들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그렇다고 하기엔 성에 안 차서 분명히 대답 못 할 것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하며
부족함을 먼저 들여다보고
남과 비교하는 삶 속에서는
그냥 항상 힘을 주고 사는 것 같다
하지만
견갑골에서 팔꿈치까지는 단단하게 힘을 줘야 하지만
팔꿈치 아래에서는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길게 보여주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발레

발레에 대한 저자의 사랑을
아주 듬뿍 느끼고 간다
우울함을 느낀다면
언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인디언의 명언처럼
춤을 추며 음악을 즐길 수 있기를
+추가+

나중에 보고싶은 것
🩰<폴리나> 바스티앙 비베스🩰
'읽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자 X 단식] 여성을 위한 슬기로운 단식 라이프스타일 / 민디 펠츠 지음 / 호르몬을 강하게 하는 음식추천 / 여성의 리듬에 맞는 단식법 (9) | 2025.03.26 |
|---|---|
| [아무튼, 잠수] 힘을 줘서 움켜잡을 수 없는게 바다였다 / 하미나 지음/ 58번째 아무튼 시리즈 - 프리다이빙 (2) | 2025.03.07 |
| 서울야외도서관 북클럽 2025 ‘힙독클럽’ 📖📚모집/완전 흥미돋 ⭐️ 4월1일만 기다린다 🙏 (9) | 2025.03.05 |
| [불교를 안다는 것 불교를 한다는 것] 아는것을 하는 기쁨 / 중현 지음 (5) | 2025.03.04 |
| [조국의 법고전 산책]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 조국 지음 (5) | 2025.02.12 |